[ESSAY] 감사합니다, '을'에게 인사를

- ▲ 박재영·'청년의사' 편집주간
사실 우리 사회는 '인사의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한쪽에서는 과잉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핍일 뿐이다
'을'이'갑'에게 하는 인사는 과잉이다
택시를 탄다. 문을 열고 좌석에 앉고 문을 닫는다. 그 순간이면 언제나 살짝 긴장을 한다. 거의 반반인 듯하다. 기사분이 "안녕하세요?" 혹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말을 붙이는 경우가 절반쯤 되고, 나머지 절반의 경우엔 잠시 침묵이 흐른다. 기사 분이 먼저 말을 꺼낼 용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나는 "○○○부탁합니다"라고 말한다. 적지 않은 경우 기사 분은 아무 대답이 없다.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인지, 엉뚱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다시 확인하기도 뭣해서, 그저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창밖을 주시할 뿐이다. 혹시나 하고 재차 행선지를 말했다가 "알아들었는데 왜 또 말하느냐?"는 퉁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럴 때의 민망함 혹은 불쾌감이란.
주차장에서 차를 뺀다. 요금 내는 곳에 가서 창문을 내린다. 십중팔구는 침묵이 흐른다. 단지 주차권과 현금이 오가고 나서 차단기가 열린다. 간혹 수금원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간혹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흔히 돌아오는 반응은 심드렁하다. '당신, 나 알아?'라는 표정이 돌아올 때도 있다.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간다. 유니폼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직원이 주차권을 뽑아주면서 높은 톤의 목소리로 제법 긴 인사를 한다(사실은 인사말이 끝나야 주차권을 준다. 아마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리라). 나도 인사를 건넨다.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 선다. 여권을 건넨다. 잠시 후 심사관은 도장을 쾅 찍은 다음 여권을 돌려준다. 끝이다. 가끔은 여권을 건네면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라고. 그런 경우엔 대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돌아온다. 물론 가끔은 아니다. '이 자가 왜 먼저 인사를 하지? 뭐 찔리는 게 있나?' 하는 눈초리를 견뎌야 할 때도 있다. 그저 인사를 했을 뿐인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다. 과하게 친절하다 싶은 종업원도 있지만, 어떤 종업원은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선다. 주방을 향해 나의 주문 내용을 외치는 경우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또 살짝 긴장이 된다. 음식이 잘못 나올까봐. 밥을 먹고 나올 때,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가 들리면 "잘 먹었노라"고 대답을 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또 고민을 한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할까 말까. 음식 맛이 괜찮았으면 흔히 내가 먼저 인사를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머쓱해질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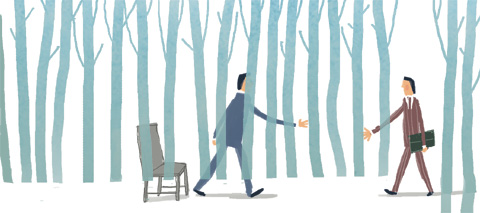
-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우리 사회가 '인사'에 인색하다고들 한다. 미국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때마다 "하우 아 유?"라는 말을 반복하고, 프랑스인들이 "파르동(pardon·미안합니다)"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것과 달리, 우리는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는 데 인색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원래 인사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일까? 우리 어휘 중에 인사말이 부족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전통문화에는 너무 격식을 차린다 싶을 만큼 온갖 종류의 인사 예절이 존재하고, "밥 먹었니?"나 "어디 가니?"와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들릴 독특한 인사말도 참 많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적절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몰랐던 민족도 아니다. 말이나 표정으로 하는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현금이 오가는 인사도 있다. '인사를 하다'라는 표현은 '부조금을 내다', '선물을 하다', '뇌물을 주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인사의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한쪽에서는 과잉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핍일 뿐이다. '을'이 '갑'에게 하는 인사는 과잉이다. 물건을 파는 쪽, 잘 보여야 하는 쪽,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쪽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인사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인사치레'도 많다. 하지만 소위 '갑을(甲乙) 관계'가 아닌 경우, 그리고 한두 번 마주치고는 다시 만나지 않을 관계에서는 인사를 너무 안 한다.
인사 자체도 부족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는 더 적다. 부하 직원이든 톨게이트 근무자든 편의점 판매원이든, 우리는 날마다 꽤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런데 그 인사에 대해 간단한 답 인사라도 하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 불쾌해지고 흐뭇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덜 불쾌하게 하고 조금씩 더 흐뭇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모두 분명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인사를 잘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이유로든 타인과 몇 마디 말을 섞게 되는 수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던지는 간단한 인사말에 무슨 말로든 '반응'을 보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뭔가 좀더 '내용'이 있는 짧은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의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해와 공감을 표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인사를 잘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자연스레 늘어나리라 믿는다. 외국인들도 다들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말 세 가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들을 조금만 더 자주 말하자. 특히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을'에게.
'[조은글]긍정.행복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ESSAY] 그곳의 가을은 찬란했다 (0) | 2010.09.25 |
|---|---|
| [ESSAY] 스와이-낭트의 자유로움 (0) | 2010.09.25 |
| [ESSAY] 선심후물(先心後物) (0) | 2010.09.12 |
| [ESSAY] 내 식의 귀향 (0) | 2010.09.12 |
| [ESSAY] 행복한 아버지 (0) | 2010.08.31 |